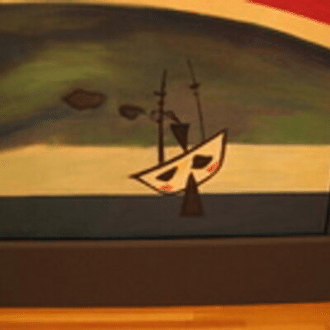『踏み絵化する社会からなんとなく好きを許容する社会へ』英語韓国語(+日本語)2025/01/24
*各言語でニュアンスが違うのは文体をそれぞれ変える練習ですのでご容赦ください。
ここ数年の傾向を見ているとすごく好きかすごく嫌いしか語られなくなっている。極端から極端に振れる傾向がより強くなっている。なんとなく好きというのがなかなか許されにくい空気さえ感じる。目には見えないけど実は好きないる人がいるという見えにくいマイノリティーの声がさらに聞こえづらくな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なんとなく好き、なんとなく嫌だという感覚的に物事を捉えることに見えにくい圧力のようなものさえ感じる。この傾向は、近年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発展と密接に関係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アルゴリズムは、極端な意見や感情的な表現を優先して拡散する傾向がある。これにより、穏やかな「なんとなく好き」「なんとなく嫌」という曖昧な立場は目立たず、議論の中心に入りにくく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例えば、ある作品や人物に対して、「すごく好き」と「すごく嫌い」が対立すると、ソーシャルメディアではその対立が可視化され、さらに拡散される。一方で、「まあまあ好き」「嫌いではない」といった中立的な意見はエンゲージメントを生みにくく、結果的に埋もれてしまう。ここで感じる「見えにくい圧力」は、社会全体が極端なポジションを求める構造にあることの現れかもしれない。また、現代社会では、自分の立場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無言の圧力が強くなっている。「なんとなく好き」と言った途端、具体的な理由を求められ、説明責任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感じる場面が増えている。これは、社会の効率化や即断即決の文化が影響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人々は、感覚的で曖昧な意見を持ちにくくなり、「賛成か反対か」という二元論に押し込められているように見える。この状況が生む問題点として、次のような点が挙げられる。1多様な声の抑圧:穏やかな、あるいは感覚的な意見が埋もれてしまうことで、社会の議論が過激化し、幅広い意見を許容しにくくなっている。2中間層の沈黙:「どちらでもない」「よくわからない」といった曖昧な立場を取ることに心理的なハードルが生じ、結果として意見を表明することを避ける人が増えてしまう。3:対話の分断極端な意見同士がぶつかることで、建設的な議論や妥協点の模索が困難になり、意見が対立するばかりで進展しにくくなる。では、この問題に対してどのような解決策が考えられるだろうか?1: 曖昧な意見の可視化を促す場の創出。ソーシャルメディアにおいて、「まあまあ好き」「どちらでもない」といった中間的な意見を尊重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や、そうした投稿を奨励するデザインが必要ではないか。例えば、意見を選ぶ際に「中間」「曖昧」などの選択肢を設け、可視化されるようにする。2:感覚的な意見を肯定する文化の醸成。学校教育や職場、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おいて、意見の多様性だけでなく、感覚的な「なんとなく」という立場を尊重し、受け入れる価値観を醸成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誰もが「明確な理由がなくてもいい」と思える風潮を作ることが大切だ。3:議論の文脈を広げる。極端な意見同士が衝突する前に、あえて「中間的な立場」や「まだ意見が固まっていない人」の意見に焦点を当て、議論を多層的にする工夫が必要だろう。メディアやコミュニティの運営者は、極端なポジションだけを目立たせるのではなく、「途中の意見」も拾い上げる努力が求められる。4:言語化のプレッシャーを減らす。すべての意見に対して「なぜ?」と問うのではなく、「ただそう感じる」ということを受け入れる文化を形成することが重要。例えば、レビュー文化においても「なんとなく良かった」「特に理由はないが心地よかった」といった曖昧な評価を許容する風土を育てることが必要だ。5:匿名性の活用と心理的安全性の確保。SNSでは、匿名性のある場を活用して、心理的安全性を高めることで、プレッシャーなく意見を言いやすくすることができる。たとえば、匿名掲示板や質問箱などの形式を活かして、気軽に「なんとなく」の意見を表現できる環境を整えることが考えられる。こうした解決策を考えながら、現状の問題を深く見つめ直すと、結局のところ、人々が「適度な距離感で意見を持つ」ことを許容する社会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情報社会の発展に伴い、あらゆることに対して意見を持つことが求められるが、それは必ずしも健全とは限らない。すべてにおいて「強く語る」ことが求められる現状を見直し、「ほどほどの態度」や「余白のある意見」が許される社会を目指す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あらゆるトピックが「踏み絵化」する社会は息苦しい。最終的に、この問題は個人の意識改革と社会の仕組みの両方からアプローチ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The trend over the past few years has been to only talk about liking it very much or disliking it very much. The tendency to swing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has become stronger. I even feel that it is difficult to be allowed to say that you like something. It seems that the voices of invisible minorities, those who are invisible to the eye but actually like someone, are becoming even harder to hear. I even feel a kind of invisible pressure to perceive things from a sensory point of view, as if I somehow like them or somehow dislike them. This trend seems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media in recent years. Social media algorithms tend to prioritise and spread extreme opinions and emotional expressions. This may make it harder for ambiguous positions, such as gentle ‘I kind of like’ or ‘I kind of don't like’, to stand out and enter the centre of discussions. For example,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really like’ and ‘really dislike’ a certain work or person, the conflict is visualised and further diffused on social media. On the other hand, neutral opinions such as ‘I like it alright’ or ‘I don't dislike it’ are less likely to generate engagement and are buried as a result. The ‘invisible pressure’ felt here may be an indication that society as a whole is structured to seek extreme positions. In addition, in contemporary society, the silent pressure to clarify one's position is becoming stronger. As soon as we say ‘I kind of like it’, we are increasingly asked to give specific reasons and feel obliged to be accountable for our actions. This may be due to society's culture of efficiency and instant decision-making. People are less likely to hold sensible and ambiguous opinions and appear to be forced into a binary ‘for or against’ position. Some of the problems this situation creates include: 1. Suppression of diverse voices: mild or sensible opinions are buried, making social debate more radical and less tolerant of a wide range of opinions; 2. Silence of the middle class: taking ambiguous positions such as ‘neither’ or ‘I'm not sure’. 3: Fragmentation of dialogue: extreme opinions clash, making it difficult to have constructive discussions and seek compromises, resulting in conflicting opinions that make it difficult to make progress. What solutions to this problem can be considered? 1: Creation of spaces that encourage the visualisation of ambiguous opinions. In social media, there is a need for platforms that respect middle-of-the-road opinions, such as ‘I like so-and-so’ or ‘neither’, and designs that encourage such posts. For example, options such as ‘in-between’ and ‘ambiguous’ should be provided and made visible when choosing an opinion.2: Fostering a culture that affirms sensible opinions. In school education, in the workplace and in online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foster a value system that respects and accepts not only the diversity of opinions, but also the sensible ‘sort of’ position. It is important to create a climate in which everyone feels that there is no need to have a clear reason for a discussion.3: Expand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Before extreme views clash with each other, it will be necessary to devise ways to make the debate multi-layered by daring to focus on ‘middle ground’ and the opinions of ‘those whose opinions are not yet firmly established’. Media and community operators need to make an effort to pick up ‘opinions in the middle’, rather than just highlighting extreme positions.4: Reduce pressure to verbalise. Instead of asking ‘why?’ to every opinion, ‘just so?’ for every opinion, it is important to form a culture that accepts that ‘it just feels that way’. For example, in the review culture, it is necessary to foster a culture that allows for ambiguous evaluations, such as ‘it was kind of good’ or ‘it was pleasant for no particular reason’.5: Use anonymity and ensure psychological safety: social networking sites can be used to increase psychological safety through the use of anonymous forums, making it easier to express opinions without pressure. It can make it easier to express opinions.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casually express their opinions ‘somewhat’ by making use of formats such as anonymous forums or question boxes. Looking deeper into the current problems while considering these solutions, I think that ultimately we need a society that allows people to ‘hold opinions with a reasonable sense of dist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people are expected to have an opinion on everything, but this is not always healthy. We should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ople are expected to ‘speak strongly’ on everything, and aim for a society where people are allowed to have ‘moderate attitudes’ and ‘opinions with a margin’. A society in which every topic is ‘stamped out’ is stifling. Ultimately, this issue will need to be approached from both the perspective of changing individual attitudes and the structure of society.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정말 좋아하거나 정말 싫어하는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 왠지 좋아한다는 것이 좀처럼 용납되기 어려운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소수자의 목소리는 더욱 듣기 어려워진 것 같다. 왠지 좋아한다, 왠지 싫어한다는 감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압력 같은 것까지 느껴진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간의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극단적인 의견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우선적으로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온화한 '왠지 좋아한다', '왠지 싫어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은 눈에 띄지 않고 논쟁의 중심에 서기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나 인물에 대해 '엄청 좋아한다'와 '엄청 싫어한다'가 대립하면 SNS에서는 그 대립이 가시화되어 더욱 확산된다. 반면,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은 중립적인 의견은 참여도가 낮고, 결과적으로 묻혀버리기 쉽다. 여기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압력'은 사회 전체가 극단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왠지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 구체적인 이유를 요구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의 효율화, 즉결처리 문화가 영향을 끼친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모호한 의견을 갖기 어려워지고,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다양한 목소리의 억압: 온건하거나 감각적인 의견이 묻혀버림으로써 사회 논의가 극단화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워진다.2중간층의 침묵: '어느 쪽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와 같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3: 대화의 단절: 극단적인 의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건설적인 토론과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의견 대립만 심화되어 진전을 이루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1: 모호한 의견의 가시화를 촉진하는 장의 창출. 소셜 미디어에서 '그저 그렇다', '둘 다 좋아한다'와 같은 중간 의견을 존중하는 플랫폼, 혹은 그러한 게시글을 장려하는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의견을 선택할 때 '중간', '애매모호함' 등의 선택지를 마련하여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각적 의견을 긍정하는 문화 조성. 학교 교육이나 직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왠지'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가치관 조성이 요구된다. 누구나 '명확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3: 토론의 맥락을 넓힌다. 극단적인 의견들이 충돌하기 전에 굳이 '중간 입장'이나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의 의견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다층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디어와 커뮤니티 운영자는 극단적인 입장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중간 의견'도 함께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언어화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모든 의견에 대해 “왜?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리뷰 문화에서도 '왠지 좋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좋았다'와 같은 모호한 평가를 허용하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5: 익명성 활용과 심리적 안전성 확보: SNS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부담 없이 의견을 말하기 쉽다. 심리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익명 게시판이나 질문하기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부담 없이 '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의견을 갖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 의견을 갖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건전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강하게 말하기'가 요구되는 현 상황을 재검토하고, '적당한 태도'와 '여백의 미'가 허용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주제가 '밟고 지나가는' 사회는 숨이 막힌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의식 개혁과 사회 구조적 측면 모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いいなと思ったら応援しよう!